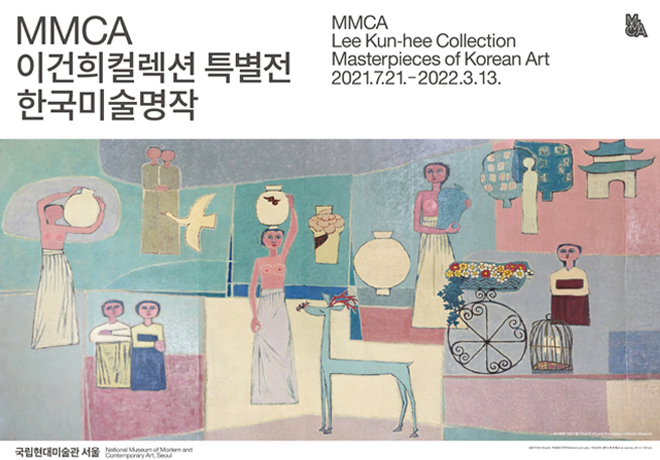1. 승효상(이로재), ‹수백당›, 1999-2000, 경기도 남양주시
Seung H-Sang (IROJE architects & planners), Subaekdang, 1999-2000, Namyangju-si, Gyeonggi-do
이번에 전시된 ‹수백당›은 ‹수졸당›과 함께 ‘빈자의 미학’을 구현한 승효상 건축가의 대표 건축인데요. ‹수졸당›이 강남 주택단지 소위 ‘집장사집’들 사이에서 삶의 양식과 공간의 형태를 고민했다면. ‹수백당›은 도심이 아닌 전원에서 닫힘이 아닌 열림을 통해 한국주거문화에 질문을 던집니다.
승효상은 1960년대 말, 양옥이라는 형식의 주택이 생기면서
전통적 공간개념이 완벽히 변했다고 분석하는데요. 우리 고유한 한옥에서는 방의 위치에 따라 안에 있으면 안방, 건너편에 있으면 건넛방이고 문간에는 문간방이라고 칭하지요. 심지어 화장실도 뒤에 있어 뒷간이라 불렀고요.
그런데 양옥에서는 목적에 따라 방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거실, 침실, 식당, 화장실처럼요. 한옥에서는 가구 등을 옮겨 방의 목적을 내가 정할 수 있다면 양옥은 거실에서는 소파에 앉고 침실에서는 잠을 자며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공간의 목적에 삶이 종속되는 건축입니다.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달라진 주거 문화, 그런데 그 혁명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승효상 건축가는 ‹수백당›을 통해 그 질문에 답을 구합니다. 50평 면적 안에 목적이 없는 12개가 있습니다. 5개는 실내지만 7개는 위가 뚫린 공간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목욕탕이나 주방처럼 어쩔 수 없이 설비가 필요한 방도 있지만
모든 방은 목적 없이 비어있습니다. 거주인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공간을 바꾸어 쓸 수 있는데요. 그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돋보이도록 방의 벽들은 백색으로 마감했고 집 이름도 수백당으로 지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런 파격적인 외관을 가진 집이 많지 않아서
건축주 부부는 살림 집이 아니라 수도원이나 미술관 같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옥과 마당을 가지고 싶었던 부부에게는 설계부터 마음에 쏙 든 집이었다지요. 들어와서 긴 복도를 걸어갈 때 쏟아지는 달빛은 볼 때마다 다른 영감을 주고 비가 오는 날의 운치도 남다르답니다. 그렇게 살아 온 시간이 25년 째, 건축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수백당›은 고치거나 증축하지 않고 25년 전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